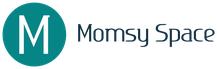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새의 주말에는 유난히 외출을 거의 안하고 있다.
주중에야 매일 지하철로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의 쳇바퀴를 타고 있고 점심도 때때로 나가서 사먹곤 하니 이래저래 바깥공기 쐴 일이 제법 있는 편이다. 하지만 금요일 퇴근종을 땡 치고 귀가해서는, 나는 일요일 밤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지지고볶으며 완전한 집순이의 생활에만 전념한다.
이번 주말도 꼭 그랬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 일을 거치며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나가질 않았던 것이다. 집에 콕 박힌 채 삼시세끼를 열심히 해먹었고, 설거지를 말끔히 했으며, 빨래도 나누어 두 번 돌렸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촘촘히 꾸몄다. 고맙게도 쓰레기 버리기와 분리수거를 아들이 도맡아주었고 대형마트 장보기는 남편이 딸과 함께 다녀왔으니 가까운 곳조차 나설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답답하거나 심심하진 않았나 자문해보면 전혀 아니다. 갑갑하지도 외롭지도 지겹지도 않다. 내내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업들을 시간 순으로 하나씩 둘씩 해나간다. 나무늘보처럼 널부러져 쉬다가도 끙차 일어나 지분지분 내 할 일을 한다. 하루가 긴 듯 하면서도 짧다.
메뉴를 열심히 궁리해 식사를 차리고 네 식구 다같이 둘러앉아 먹는다. 치우고 정리하고 한숨 돌리다가 후식을 먹고 차도 마시며 독서도 몇 권 한다.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학교와 친구,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좀 하고나서 영화도 한두 편 감상한다.
집안일을 순서 잡아 차근차근 해내고, 사랑스러운 우리집 고양이들과도 놀아준다. 영상을 시청하고 뉴스와 기사도 본다. 가족들과 수다를 떨고 사진도 찍고 예전 앨범도 본다. 아니 이렇게나 집 안에서만 할 것들이 많은데, 주말 내내 내가 집안을 못 벗어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집에만 있다보면 내 집이 더 아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마법도 생겨난다. 이 안에서 어디를 좀 더 손보고 다듬고 어루만져줘야 할지가 보인다.
평상시에는 아침 일찍 종종거리며 떠나 밤에 터벅대며 걸어들어오는 공간. 차분히 집과 한 몸이 되어 휴식하고 뒹굴거리고 살펴보고 하다보면 내 몸의 지친 피로가 말끔히 녹아버리는 것은 물론인데다 내 집 내 공간에의 애정도 더욱 샘솟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가 목전인, 집순이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남편이 사다준 육포를 안주삼아 밀맥주를 한 잔 하며 말한다.
"주말 내내 한 발짝도 집에서 안나갔어. 근데도 하나도 안 심심했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한다.
"그게 바로 행복인거지. "
그렇다. 집순이 일상이 얼마나 좋은데.